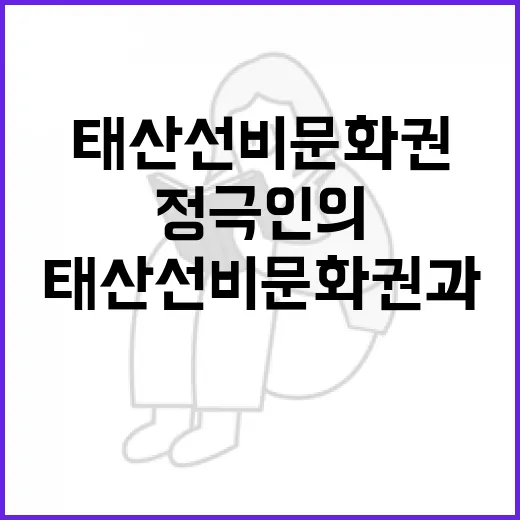태산선비문화권과 정극인의 상춘곡

태산선비문화권과 정극인의 상춘곡
봄을 노래하는 서양의 클래식 음악이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가사문학이 있습니다. 가사문학의 대표작으로 흔히 담양의 송순의 면앙정가와 정철의 성산별곡이 떠오르지만, 그 효시는 바로 불우헌 정극인의 상춘곡입니다.
정극인의 상춘곡은 봄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작품으로, 도연명의 귀거래사를 연상시키는 이상향의 세계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교과서에도 수록되어 수능에서 자주 출제되는 단골 작품이기도 합니다.
불우헌집에 실린 80행의 상춘곡 현대적 해석본을 통해 작품을 음미해 보면, 홍진(속세)에 묻힌 삶 속에서도 자연과 벗하며 진정한 즐거움을 찾는 선비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 상춘곡 주요 구절 |
|---|
| 홍진에 묻힌 분네 이 내 생애 어떠한고. 옛사람 풍류에 미칠까 못 미칠까? 천지간 남자 몸이 나만 한 이 많건마는 산림에 묻혀 있어 지락을 모를 건가. 몇 칸 초가집을 푸른 시내 앞에 두고 송죽이 우거진 속에 풍월주인 되어 있어라.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복사꽃 살구꽃은 석양 속에 피어 있고, 푸른 버들 꽃다운 풍은 이슬비 속에 푸르도다. 칼로 재단해 냈는가, 붓으로 그려 냈는가, 조물주의 신이한 재주 사물마다 야단스럽다. 수풀에 우는 새는 봄기운을 못 이기어 소리마다 교태로다. 물아일체이러니 흥이야 이와 다를소냐. ... |
정극인은 경기도 광주 출생으로, 17세에 전남 영광으로 내려가 성균관에 입학했습니다. 세종 때 흥천사 중건 과정의 부당함을 항소하다가 사형 직전까지 갔으나 귀양 후 풀려나 태인으로 내려왔습니다. 이후 1453년 단종 때 벼슬을 했으나 계유정란이 발발하자 벼슬을 그만두고 태인으로 돌아와 불우헌을 지었습니다.
태인에서 정극인은 태산선비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태산선비문화는 무릉도원을 꿈꾸는 이상향을 실현하려는 정신으로, 고현동향약과 무성서원이 자리한 정읍 지역에서 꽃피웠습니다.
태산선비문화권에는 최치원, 신잠, 정극인 등 선비들이 포함되며, 이들은 이상향을 추구하고 그 정신을 문학으로 승화시켰습니다. 특히 정극인의 상춘곡은 이 문화권의 대표적 작품입니다.
정극인은 고현동향약을 통해 현대적 복지 개념에 가까운 사회적 약자 지원과 신분 해방을 주장했습니다. 정읍에는 무성서원, 향교, 정자 등 선비들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고현동향약은 태산사에서 시작되었으며, 이 정신은 이후 동학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선비들이 추구한 이상향의 세계가 상춘곡에 담겨 있습니다.
조선 선비들은 도연명의 무릉도원을 이상향으로 꿈꾸었고, 가사문학은 시조와 산문의 중간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정극인의 상춘곡은 송순과 정철의 작품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정극인은 동진강이 바라다보이는 곳에 초가를 짓고 안빈낙도의 삶을 살며 상춘곡을 창작했습니다. 작품에는 "공명도 날 꺼리고, 부귀도 날 꺼리니"라는 구절에서 뜻을 펴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드러납니다.
난세를 지나며 초야에 은둔하는 선비의 삶과 안빈낙도의 정신은 현실 참여의 또 다른 방식일 수 있습니다. 상춘곡은 물질적 풍요가 인간의 행복과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욕망을 멀리하는 것이 미덕인 오늘날, 상춘곡에서 추구하는 안빈낙도는 욕구를 내려놓음으로써 얻는 진정한 자유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정극인의 삶과 문학은 풍류 속에서 성찰과 진정한 가치를 되새기게 합니다.
태산선비문화는 백제의 태산군에서 유래했으며, 이상향을 꿈꾸던 선비들의 정신이 살아 숨 쉬는 문화권입니다. 이 정신 자산은 오늘날에도 깊은 감동과 함께 현실적 가치에 대한 성찰을 불러일으킵니다.